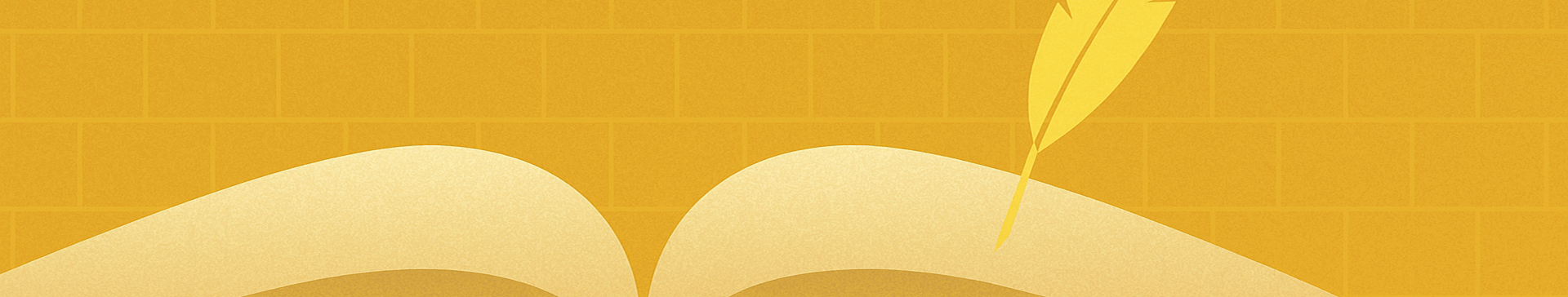어머니의 침묵이 들려주는 이야기
페이지 정보

본문
새들이 지저귀는 싱그러운 아침입니다. 숲이 있던 자리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나무 한 그루에 의지해 노래하는 새소리를 들으며 새벽 공기를 들이켭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 문득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저릿해옵니다.
'어머니는 간밤에 잘 주무셨을까? 오늘 아침 컨디션은 어떠실까?'
코로나19라는 지독한 전염병이 우리 모녀 사이를 갈라놓은 지 어느덧 1년. 지난해 7월, 어렵게 성사된 비대면 면회가 떠오릅니다. 투명 가림막 너머 휠체어에 앉아 계시던 어머니는 좀처럼 저를 쳐다보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막내딸 명화가 왔어요. 저 좀 봐주세요!"
아무리 외쳐도 묵묵부답인 어머니. 복지사님은 "따님이 오랫동안 안 찾아와서 삐지신 것 같다"고 귀띔해주셨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달려가 볼을 비비고 손을 맞잡았을 텐데, 가림막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발만 동동거려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유독 좋아하시는 대봉감이 생각났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베란다에서 정성껏 숙성시켜 얼려둔 붉은 홍시. 저는 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엄마! 엄마 좋아하시는 감이에요!"
그제야 어머니의 눈이 동그래지며 "아고~ 아고~" 탄성을 지르셨습니다. 붉은 감을 눈에 담으신 후에야 비로소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셨지요.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그 눈빛은 수만 마디 말보다 더 깊은 안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막내딸이 왔구나. 보고 싶었다. 잊지 않고 와주었구나. 별일 없지? 사위도, 애들도 다 잘 있는 거지? 그럼 됐다….'
가슴이 울컥 메어왔습니다. 침묵 속에 오간 그 깊은 대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어머니께 다짐했습니다.

'토끼처럼 평생을 쉬지 않고 뛰어다니며 7남매를 키워내신 우리 어머니. 그 조그만 몸으로 세상 모진 풍파를 다 막아주셨던 당신의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온몸으로 보여주신 그 인내와 사랑이 오늘 저를 살게 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제일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모곡 #요양원면회 #대봉감 #어머니의눈빛 #코로나이별 #그리움 #김명화작가 #부모님생각 #가족사랑 #효도 #자서전 #토끼같은어머니
- 이전글비가 내리면 그리움도 젖어 듭니다 25.12.01
- 다음글증오의 껍질을 깨고 진실을 마주하다 25.11.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