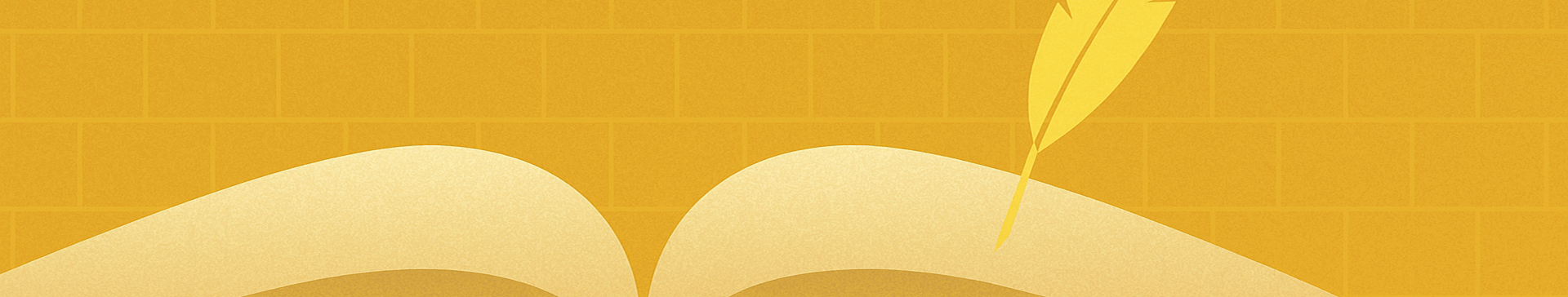펜으로 꿰맬 수 없는 상처도 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아버지는 천사셨어요. 제게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반말을 하신 적이 없죠. 식사 때면 물도 떠다 주시고, 라면도 직접 끓여주시고요…. 잠들기 전에는 제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가 말하는 ‘영등포 아버지’는 지옥 같은 노숙 생활에서 만난 구원자였습니다. 받은 은혜를 남에게 갚고 싶다고 말하는 그의 눈빛은 잠시나마 온화하게 빛났습니다. 맨손으로 자수성가해 집을 장만하고 밥 굶을 걱정 없이 살게 된 지금, 그는 분명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밑바닥에는 여전히 시뻘건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이제 걱정 없이 사시니, 남은 가장 큰 숙제는 뭔가요?”
저의 질문에 그는 기다렸다는 듯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밝혀야죠. 그 여자가 친모가 아니라 계모라는 사실을요.”
대화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계모라는 사실’을 밝혀 억울함을 풀고, 세상이 자신을 제대로 봐주어야 비로소 새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의 주장. 그것은 일종의 주문 같았습니다.
친모를 부정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만 비로소 세상이 자신을 인정해 줄 거라는 믿음. 대화는 뫼비우스의 띠처럼 그 지점을 맴돌 때마다 상처받은 아이가 밖으로 나오고 싶어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절박한 두드림 앞에서 저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심리학이나 상담을 공부했더라면, 저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줄 수 있었을까….’
들어주는 것 말고는 별다른 도움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작가로서 못내 안타깝고 미안한 밤이었습니다.
#자서전대필 #김명화작가 #트라우마 #치유 #영등포아버지 #따뜻한손 #기억의감옥 #작가노트 #상처받은내면아이 #경청 #인생기록
- 이전글상처를 헤집는 일일까, 독을 빼내는 일일까 25.11.30
- 다음글증오의 늪에서 건져 올린 희망 25.11.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