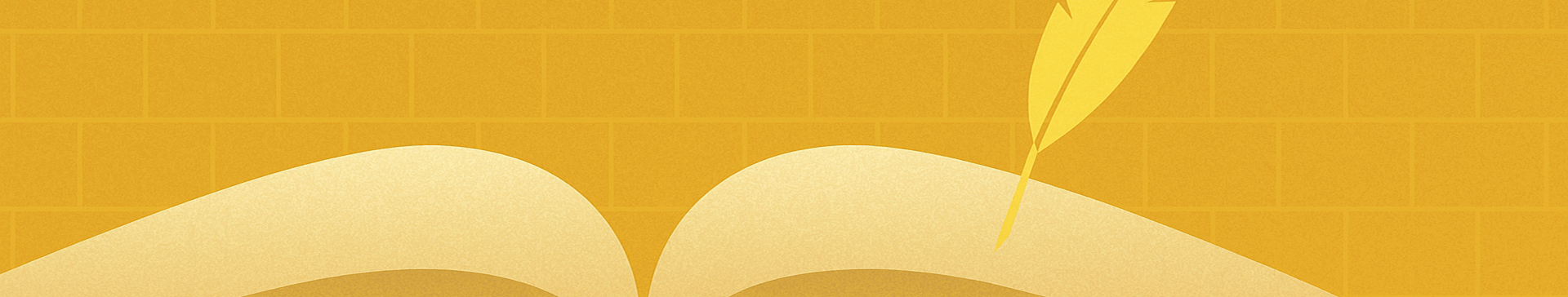내 안의 아프리카, 그리고 이모의 하얀 광목자루
페이지 정보

본문
우리는 모두 가슴 속에 자신만의 ‘아프리카’를 품고 사는 건 아닐까요? 지도에는 없는 곳, 그러나 내면 깊은 심연에서 진정한 나를 부르는 비밀스럽고도 원초적인 부름 같은 것 말입니다. 그 낯선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고 온전히 나를 맡길 때, 우리는 삶이 숨겨둔 보석 같은 ‘우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칼 융(Carl Jung)은 이를 ‘동시성(Synchronicity)’의 원리라 명명했지요. 우리가 흔히 ‘뜻밖의 발견’ 혹은 기적 같은 우연이라 부르는 순간들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내면에 깊은 관심을 기울일 때 우주가 보내오는 다정한 응답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술이란 결국 내 안에서 반짝이는 그 아프리카를 발굴해 내는 작업이 아닐까 합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묻혀 있던 진실을 밖으로 길어 올릴 때, 그것은 비로소 빛을 발하며 우리의 무관심을 흔들어 깨웁니다. 마치 “이것 봐, 네 안에도 이런 빛이 있었어”라고 말을 걸어오듯 말이죠.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한, 이 동시성은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고 굳게 닫힌 영혼의 다락방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제 삶에서 그 어둠을 단숨에 걷어내고 환한 빛을 비추어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몸을 빌려 세상에 나온 일곱 남매를 온몸으로 길러내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일곱 자식들이 낳은 손주들까지, 당신의 굽은 등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살지만, 한국에서 속옷 가게를 하며 고생하는 셋째 언니가 안쓰러워 밥을 짓고 빨래하며 손주를 키워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언니네 가서 일을 해주시는 동안 텅 빈 시골집에 홀로 남겨진 막내딸이 무서울까 봐, 그때마다 구원투수처럼 오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작은 어머님, 그리고 저의 큰이모님입니다. 어머니를 떠올리니 자연스레 오버랩되는 얼굴, 바다처럼 마음이 넓고 후덕하셨던 작은 어머님, 유난히 희고 고우셨던 큰이모님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큰이모님은 어머니와 무척 닮으셨는데 자매들 중에서도 유독 피부가 백옥처럼 희고 고운 절세미인이셨습니다. 거친 시골의 땡볕 아래서 평생 농사일을 하시면서도 어떻게 그리 뽀얀 피부를 간직하셨는지 지금도 미스터리입니다. 언젠가 제가 그 비결이 궁금해 여쭈었습니다.
“이모는 어떤 화장품을 쓰시길래 피부가 이렇게 고우세요?”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바른다.”
비누 세안도, 흔한 로션 하나도 바르지 않고 오직 맑은 물로만 세수하신다는 그 소박함이 오히려 경이로웠습니다.
그 고운 얼굴 뒤에는 참으로 신산(辛酸)한 세월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찍이 홀로 되신 이모님은 네 남매를 억척스럽게 키우셨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얼굴도 본 적 없는 제 이모부님은 한량 중의 한량이셨답니다. 바람처럼 도포 자락 휘날리며 밖으로만 돌던 분. 이모님이 시장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푼푼이 모은 돈을 항아리에 채워두면, 며칠 만에 나타나 그 항아리를 들고 홀연히 사라지곤 하셨답니다.
돈이 떨어지면 다시 들어와 항아리를 비우고, 또 나가기를 반복하더니... 어느 날은 영영 돌아오지 않는 ‘내일’이 되어버리셨습니다.
이모님은 병아리처럼 입을 벌리고 우는 네 남매를 오물오물 곁에 품은 채, 사라진 남편을 원망할 겨를도 없이 그 모진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내셔야 했습니다.
이모님은 팔십이 넘은 나이에도 당신의 나이를 잊은 채 사셨습니다.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노동의 나날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깊은 산속을 헤매며 고사리며 취나물을 뜯어오셨습니다. 도대체 그 깊은 산 어디에 숨겨진 약초들을 그리도 잘 찾아내시는지, 해 질 녘이면 하얀 광목자루에 당신 키만 한 산나물을 가득 채워 이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다듬어 다음 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장터 좌판에 앉으셨지요.
자식들이 다 장성하여 남부럽지 않게 사는데도, 이모님은 뙤약볕 아래서 쉼 없이 돈을 벌어 허리춤의 전대(돈주머니)를 채우셨습니다. 하루는 너무 속상해서 제가 따지듯 여쭈었습니다.
“이모, 언니 오빠들이 다 잘 사는데 왜 이 위험한 산을 오르내리며 고생을 사서 하세요?”
이모님은 덤덤하게, 그러나 묵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산에 가면 귀한 나물이 지천이다. 나 죽으면 베옷(수의)도 지어야 하고... 초상을 치르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내 수의 값이라도 마련해 놔야지.”
“아니, 자식들이 다 알아서 해드릴 텐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애들도 살아야지.”
‘그 애들도 살아야지.’ 그 짧은 한마디에 담긴, 뼈를 깎는 모성애에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모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돌아가신 뒤 남겨진 낡은 전대 속에는 꼬깃꼬깃 모은 돈 700만 원과 함께 ‘초상 치를 때 써라’라고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가는 길조차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그 굽은 허리로 산을 오르며 준비하신 이별의 선물이었습니다.
남에게 신세 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셨던 강인한 분. 우리 어머니가 쌀이라도 한 포대 보내면 불호령을 내리며 돌려보내시던 분. 자매의 우애가 유독 깊어, 이모님이 떠나시자 어머니는 한동안 몸져누울 만큼 힘들어하셨습니다.
이제는 모두 옛날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아프리카에는 여전히 하얀 광목자루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오는 이모님의 모습이 별처럼 박혀 있습니다.
“보고 싶어요, 이모. 사랑해요. 그리고 죄송해요.”
살아 생전 따뜻한 로션 한번 발라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오늘따라 제 마음을 젖게 만듭니다.
#내면의아프리카 #동시성 #사모곡 #큰이모 #광목자루 #수의 #모성애 #신산한세월 #김명화작가 #삶의예술 #그리움 #인생기록#자서전 #자서전 대필 #자서전 대필 작가 #대필 작가 #자서전 작가 #회고록 #회고록 작가 #글쓰기 #자서전 쓰기 #대필 비용 #대필 작가의 소양 #교감 #공감 #경청 #인터뷰이 #인터뷰어
- 이전글당신이 남긴 유산, "읽고 쓰거라" 25.12.02
- 다음글고통을 응시하는 힘, 그것이 삶의 품위였다 25.12.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